"300km/h로 달리는 차가 춤을 춘다?"
포뮬러 원(F1) 개막을 한달여 앞둔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프리시즌 테스트가 진행됐다. 레이싱 스펙을 적용한 경주차들이 처음으로 서킷을 달리는 날, 대부분의 경주차에서 앞뒤로 요동치는 '포퍼싱(porpoising)' 현상이 목격됐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문제점을 살펴보기 앞서, 2022시즌 신형 경주차에 적용된 그라운드 이펙트(지면효과)를 살펴봐야 한다. 그라운드 이펙트는 차체 바닥을 지나는 공기의 압력을 낮춰 다운포스를 극대화하는 공기역학 기술이다.
그라운드 이펙트를 활용하면 고속 안정성 증대와 더불어 높아진 접지력을 통해 코너링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감속 시 순간적으로 줄어든 다운포스로 차량 조작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동반한다. 공기역학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1970년대 많은 드라이버들이 그라운드 이펙트로 인한 사고를 경험했다.
안전상 이유로 1982년부터 금지됐던 그라운드 이펙트가 올해부터 다시 허용됐다. 규정 변화로 인해 줄어든 다운포스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F1 측은 현재 기술력으로 그라운드 이펙트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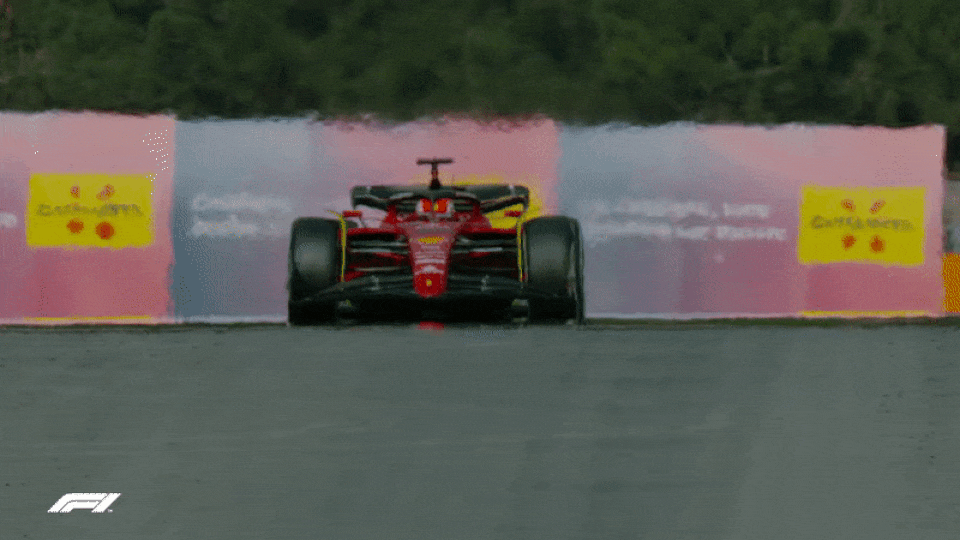
그러나 공기역학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그라운드 이펙트 도입과 동시에 각 팀의 경주차에서 포퍼싱 현상이 발견됐다.
고속으로 달리는 경주차는 그라운드 이펙트가 만들어낸 다운포스로 인해 점차 지면과 가까워지게 된다. 차량이 한계 이상으로 낮아지면 공기가 흐를 공간이 부족해져 다운포스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차량 앞 부분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때 높아진 차량 하부로 공기의 흐름이 다시금 원활해지며 차량을 또 한번 눌러준다.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차가 앞뒤로 요동치는 포퍼싱이 발생한 것. 각 팀들은 컴퓨터 시뮬레이터로는 예측할 수 없던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스쿠데리아 페라리 마티아 비노토 감독은 "경주차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 현상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고, 레드불 레이싱 크리스천 호너 감독은 "그라운드 이펙트를 도입하면서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포퍼싱 현상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는지에 따라 시즌 초반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F1과 팀들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