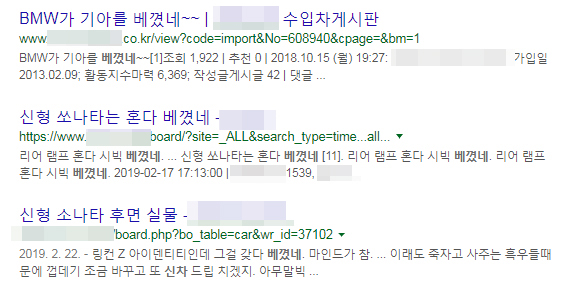
신차 출시소식에 100% 따라붙는 댓글이 있습니다.
‘무슨무슨 차와 닮았다. 어디어디가 똑같다. 어느 것을 베꼈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적과 브랜드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어느 나라 네티즌들이나 신차 관련 게시판에 이와 같은 글들을 도배하다시피 올립니다.
닮은 곳 찾아내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추상 속의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의 눈썰미로 디자이너의 표절시도(?)를 발각한 것처럼 한 마디씩 던집니다.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느낌적인 느낌일 분인데도 말이죠.

자동차회사 디자이너들도 이런 현상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차가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표절운운 되는 것을 신차 출시 때마다 겪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디자이너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 ‘그러려니’ 하며 무덤덤해 하는 편입니다. 물론 기분 좋은 현상일 수는 없겠지요. 저런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 획기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싶은 욕심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새로움’이라는 개념이 양날의 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이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말은 즉, 조금만 잘못 나가면 이질적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나에게 너무 이질적인데도 선뜻 구매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낯설고 새로운 디자인과 익숙하고 평범한 디자인은 다음의 4단계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0. 그 어느 것과도 비슷하지 않을 만큼 새로우면서, 그래서 너무 이질적이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디자인
1. 그 어느 것과도 비슷하지 않을 만큼 새로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
2. 새롭지 않아 비슷한 무언가가 연상되지만, 그만큼 친숙하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
3. 새롭지 않아 비슷한 무언가가 연상되면서, 너무 뻔하기까지 해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디자인

보통의 자동차들은 2번 정도의 디자인을 취합니다. 신선함이 적더라도, 앞서 시장에 안착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성공을 노립니다. 물론 전세계 브랜드가 최적화된 설계와 생산체제를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산브랜드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이런 노선을 취해 왔지만, 전세계 대다수 자동차 브랜드가 비슷한 방법으로 디자인하기 때문에 누가 누굴 일방적으로 베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구분도 안 될 만큼 서로가 서로를 참고해가며 디자인하는 것이지요.

모든 디자이너들이 하고 싶은 궁극의 디자인은 당연히 1번입니다. 그 이전까지 세상에 없었던 완전한 새로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금방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판매까지 잘 되는 디자인. 이걸 실현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전세계 자동차회사에서 백지수표를 내밀며 모시고 갈 테지요.
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을 선뜻 시도하기가 무서운 이유는 1번과 0번이 종이 한 끗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우면서도 수긍 가능한 디자인을 노리고 싶지만, 한 끗 차이로 이질적인 디자인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새롭지만 이질적이지 않은, 새로우면서도 수긍 가능한 디자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최근 출시된 현대자동차 3종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진은 신형 아반떼와 팰리세이드, 그리고 신형 쏘나타입니다.
기본적으로 셋 모두 개성 넘치는 디자인입니다. 새롭습니다. 디자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익숙함 보다는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참고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스타일링 노선을 택했습니다. 아반떼 곳곳의 삼각형 요소들이나, 팰리세이드의 상하로 나뉘어 연결되는 주간등, 신형 쏘나타의 크롬으로 흡수되는 라이팅 연출 등은 분명히 매우 새롭습니다. 새로운 핵심요소를 가장 눈에 띄는 얼굴 전면에 배치해 현대차 만의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3대 모두 과거에 본적 없는 신선함으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3대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반떼는 신형 디자인이 조롱 당할 정도로 강한 비판여론에 휩싸여있는 반면, 팰리세이드는 놀라운 호평에 이어 판매대수도 그들 스스로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반면 신형 쏘나타 디자인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확연하게 나뉘어 대립 중인 상황인 듯 합니다.
신형 아반떼, 팰리세이드, 신형 쏘나타.
이 세 대의 차종은 같은 회사 같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엇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향성(=안정성보다는 새로움 추구)을 가지고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도 시장의 평가는 180도 다르게 나뉜 것입니다.

다시 새로움과 익숙함의 4단계로 돌아가자면, 그만큼 0번과 1번 사이의 컨트롤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새롭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디자인과, 새로우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 사이의 조절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전세계적 스타디자이너들을 한데 모아놓은 디자이너 어벤져스 같은 조직에서조차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시도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참고에 참고를 이어가는 안정적이고 재미없는 디자인보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선두에 나서는 과감한 시도를 계속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도 정답은 없어서, 계속된 무모함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헛스윙만 계속 하는 무능력한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티뷰론 시절부터 보여주었던 새로움에 대한 감각은 물론이고, 디자인도발을 이어간 최근의 3차종만 보아도 팰리세이드는 홈런을 쳤으니 승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무능력한 디자인집단이 아니라면, 모험과 도전은 더 넓고 풍성한 결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 결과 중 확실한 한 가지는 무색무취에서 탈피해, 전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확실하게 인식되는 현대자동차만의 또렷한 느낌이겠지요.
바로 그것이 그들 스스로가 그토록 갖길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삼각떼’ 하나 정도 잃어도 좋습니다.
끊임 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시도와, 이를 통해 시장에 통하는 디자인을 기어코 내 놓는 회사라는 브랜드이미지만 얻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